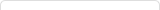안녕하세요, 고승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경영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앤디 몰린스키 브랜다이스대 교수와 HBR이 가진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이 아티클의 제목부터 뒤통수를 치는 기분입니다. 사람들은 ‘기업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온갖 조직과 전략적 프레임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제목은 바로 “글로벌화의 주체는 기업 아닌 사람이다”입니다. 글로벌 전략의 처음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계약을 추진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글로벌화를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몰린스키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문화에 적응하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떠오르시나요? 아니,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자신의 배경문화와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부터 연구하겠지요?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몰린스키 교수는 이렇게 ‘추상적인 지식’만으로는 절대 제대로 된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직원이 혹은 다른 문화권의 나라나 지역으로 파견을 간 직원이 문화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글로벌 전략은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그는 ‘미시적 과정’ 즉 ‘구체적 행동’을 알고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익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인 남자가 미국 직장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보죠. 미국인 직장상사가 “요즘 어때요? How are you doing these days?”라고 물으면 아마 미국인 부하직원은 특유의 열정적인 제스처와 함께 “Oh, great!”라며 좀 오버스럽게 떠들겠지요. 하지만 좀 진중하고 딱딱한 문화 속에서 자란 독일인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몰린스키 교수에 따르면 독일인 부하직원은 그저 “잘 지냅니다”라고 적당한 선에서 반응해주면 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되 어색하게 다른 미국인들과 똑같은 화법과 행동을 보일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문화의 요구수준’은 많이 과장돼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용 가능한 행동범위는 넓다는 겁니다. 이를 ‘적정지대’라고 부릅니다. 몰린스키 교수는 사람들이 갖는 ‘열정과 솔직성의 강도’, ‘격식에 대한 중시 정도’, ‘자기주장과 홍보, 그리고 은폐의 적정한 수준’ 등을 중심으로 적정지대를 직원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각자 자신의 문화와 개인성향에 따라 적정한 행동으로 인정받는 범위와 개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를 각각 생각해보고 그 간극에서부터 자신의 적정지대를 찾아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조금씩 더 불편해지더라도 조금씩 행동을 바꿔보고 반응을 보면서 적정한 지점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 경험하면서 조금씩 조정해가야하는 것이고요, 실제 구체적 행동을 통해 연습해야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몰린스키 교수는 방금 말한 ‘적정지대’를 찾아가고 조정한 성공적인 사례 하나를 들려줍니다. 미국에 있는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일하게 된 러시아 여성 얘깁니다. 그녀는 좋은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을 어필해야하는 미국 회사 특유의 문화가 별로 맘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임의대로 프로젝트가 배정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내가 그걸 잘 할 수 있으니 하겠다’는 말 자체는 익숙지가 않았던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자기주장과 홍보’ 측면에서 ‘적정 지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마법의 단어’ 하나를 찾아냅니다. ‘도움’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녀는 중요한 프로젝트,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나오면 ‘제가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라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에서 조직이 수용할 수 있는 행동범위의 마지노선으로 이동한 거지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조직과 거기에 적응하는 직원이 윈윈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한 미국인 관리자는 인도출신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으면서 부하직원의 역량을 키워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직원들은 자신의 상사가 무능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다는군요. 적정지대에서 만나지 못한 거지요. 이럴 때에는 툭 터놓고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져야한다는 게 몰린스키 교수의 조언입니다. 또한 이런 오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평소에 문화적 공감대를 늘리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일하는 네덜란드인이라면, 미국인스러운 유머를 파워포인트에 집어넣어 놓고 ‘앗 제가 지금 네덜란드인답지 않은 짓을 하고 있네요’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 이사람이 우리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고 있구나. 네덜란드와 우리는 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화의 주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그랬지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우리 동양권 사람들은 너무나 친숙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몰린스키 교수 역시 대가답게 ‘결국 중요한 건 관계형성’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아주 잘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다소 큰 잘못을 저질러도 이해하고 넘어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호의를 얻고 있다고 느낀 당신은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지고 용기를 얻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몰린스키 교수는 마지막으로 기업의 강력한 규범으로 ‘모두가 적응하도록’ 찍어 누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직원 중에 현지인과 글로벌화된 직원 즉 코스모폴리턴의 비율을 늘려야 하고, 입사한 사람들이 코스모폴리턴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유도하는 문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딱딱한 전략프레임보다 유능한 인재들이 글로벌화의 성공을 이끌 듯, 엄격한 규범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문화’가 ‘사람들의 적응과 관계형성’의 성공을 이끈다는 겁니다. 관료적인 규범과 규칙, 융통성 없이 짜여진 전략의 실행만 강조하는 조직이라면, 다시 한 번 곱씹어볼 얘기들입니다. 감사합니다.